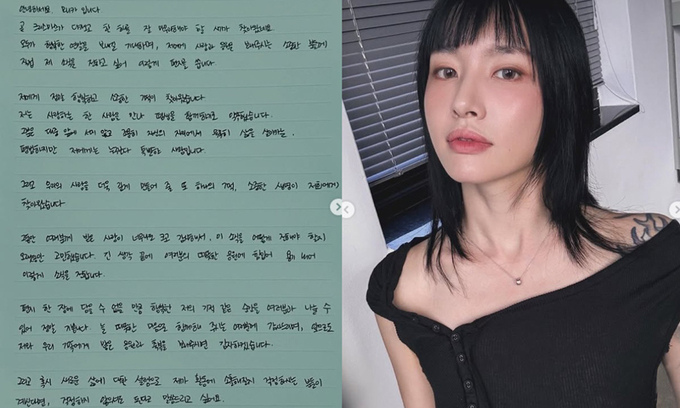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유행은 돌고 도는 법.’
V리그에 부는 ‘외인 사령탑’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남자부 5명, 여자부 1명으로 총 6명의 외인 감독이 코트를 누비고 있지만, 이 흐름이 언제 차갑게 식을지 모른다는 뜻이다.
외인 감독은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다.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한국만의 수직적인 위계질서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아울러 세계 배구 트렌드를 불러들여 추락하고 있는 한국 배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기대점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선수단 내부 파악이나 상대팀 분석에 있어서는 국내 지도자들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어 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쉽지 않고, 리그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배구계 고위 관계자는 “외인 감독들이 늘었는데, 솔직히 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은 선수 구성이 좋은 팀이 성적이 나는 그런 상황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 외인 선수 부상 이탈이 많은데, 결국 그 1명이 빠지면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좋은 감독이라도 그 자리까지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봉우 KBSN 해설위원도 “(외인 감독) 다섯 분이 진짜 자기만의 색깔을 내실 줄 알았는데, 그 점에서 조금은 실망한 부분도 있다. 한국 배구를 전체적으로 낮게 보고 들어왔다는 느낌도 받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종의 ‘외인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벌써 몇 구단에서 ‘다음에는 외인 감독을 쓰지 않겠다’고 말이 나온다. 소통도 잘 안되고, 고집도 세다고 한다. 일부 외인 선수들의 태업과 비슷하게, ‘잘 안되면 돌아가면 된다’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 컨트롤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태웅 SBS스포츠 해설위원도 “성적을 내야 하는 건 모든 감독이 마찬가지지만, 짧게 우리 리그에 머무는 외인 감독은 성적이 더 급할 수밖에 없다”며 “훈련도 당장의 볼 훈련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 장기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키려면 기초 체력을 닦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중요한 법이다. 구단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어 가거나 새로운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외인 감독 유입으로 국내 지도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감독 1명 영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치, 분석관 등 하나의 ‘사단’이 몰려오기 때문. 한국 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자 육성도 선수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지만, 이 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남자부 팀을 이끄는 한 단장은 이에 대해 “분명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안 그래도 한국 배구가 선수, 지도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서도 “무작정 국내 지도자 밥그릇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전처럼 이름만으로 자리에 앉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가 찾아주나. 절대 안 찾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인지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