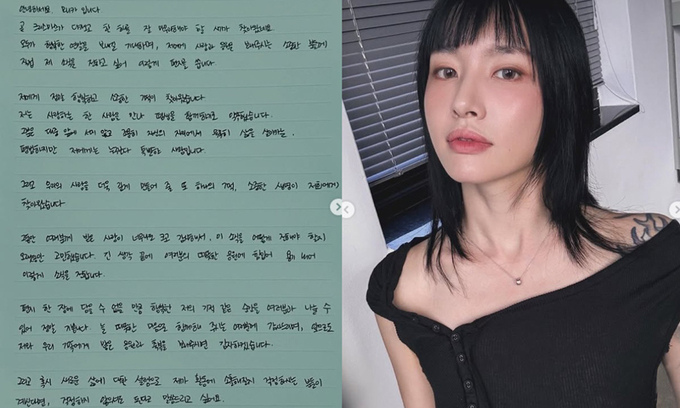배우 최민식이 영화 티켓 가격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이후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20일 이병태 KAIST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민식은 출연료를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팬데믹 중에 영화관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은 출연료를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나. 영화관 사업을 자선사업으로 알고 있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7일 방영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최민식은 “지금 1만5000원인데 스트리밍 서비스 앉아서 여러 개 보지 발품 팔아서 (영화관 가겠느냐)”면서 티켓값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 한다”며 “관객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기획하자는 게 아니라, 내(제작자)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의 발언이 퍼지면서 이번 이 교수의 발언을 포함해 영화 티켓값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와 같이 최민식을 비판하며 배우 출연료가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하는 시선도 나왔지만, 최민식의 발언에 공감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티켓값이 높아진 이후에도 최민식이 예시로 든 ‘파묘’ 등 천만 관객을 달성할 정도로 사랑받는 영화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영화평론가 이동진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비슷한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한국영화 위기론에 대해 “(한국 영화들이) 너무 패턴화되어 있고, 질적으로 저하돼 있거나, 지나치게 장르화·공식화되어 있다”며 “지금 한국 영화의 위기는 한국 영화 창의성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어떤 작품은 창의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에도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예외가 이따금씩 나오는 것이 관성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은 업계 일부의 게으른 태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여전히 영화를 사랑하고, 작품을 보고 싶어한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관객들은 영화를 안 보는 게 아니다. OTT가 저렴하고 편하다 한들 여전히 “OTT로 보면 집중이 안 된다”“영화관에서 보던 시절이 그립다”며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자체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영화관에 선뜻 가지 못하는 건, 만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표값을 감당할 만큼 뻔하지 않고 재미있는 작품이 없기 때문.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충을 출연하는 관계자들도 점점 영화관에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관객들도, 결국은 모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각자의 이유는 다를지언정 양측 모두가 재미있는 작품을 바라마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최민식이 주연을 맡은 영화 ‘파묘’는 파묘가 이뤄진 묫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LA, 거액의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은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난다. 조상의 묫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화림은 이장을 권하고, 돈 냄새를 맡은 최고의 풍수사 상덕(최민식)과 장의사 영근(유해진)이 합류해 파묘를 시작한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