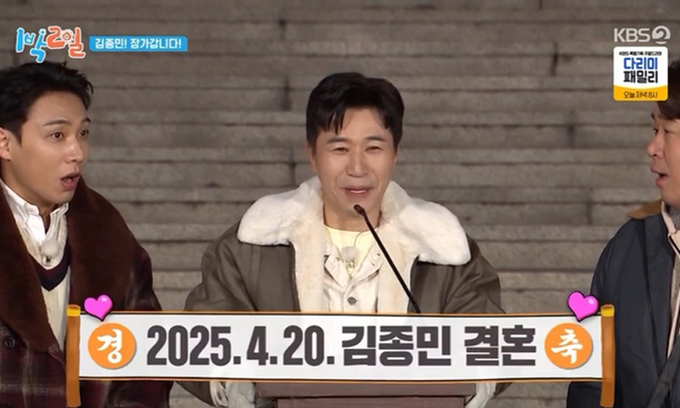이승찬(왼쪽)이 6일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급 패자부활전에서 아민 미르자자데(세계 1위·이란)에게 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승찬이 0-9로 테크니컬 폴패를 당했다.
무너진 한국 레슬링,
레슬링은 한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였다. 역대 올림픽 1호 금메달을 선사했다. 양정모가 1976 몬트리올 대회 남자 레슬링 자유형 62㎏급서 정상에 올랐다. 손기정이 1936 베를린 대회 마라톤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건지 정확히 40년 만이었다. 유도와 함께 양궁, 태권도에 뒤를 잇는, 역대 올림픽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낸 종목이기도 했다. 36개의 메달 중 11개가 금메달이었다. 심권호 등 굵직한 스타들도 대거 탄생했다.
세월이 무상하다. 찬란했던 영광은 이제 과거가 됐다. 한국은 더 이상 레슬링 강국이 아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급 이승찬(강원체육회)을 비롯해 남자 그레코로만형 97㎏급 김승준(성신양회), 파리행 막차를 탄 여자 자유형 62㎏급 이한빛(완주군청)까지. 출사표를 낸 3명의 자원 중 단 한 명도 1라운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 선수 합계 득점 2점, 실점 36점이라는 다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 레슬링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삼성이 퇴장하면서부터다. 삼성은 1982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사를 맡아 3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뒷받침했다. 삼성이 지위를 포기한 뒤 한국 레슬링은 새 후원자를 찾지 못했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체육계의 고질병인 파벌 싸움으로 번졌다. 그 사이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기존 선수들은 나이를 먹어갔고, 미래를 이끌 유망주는 발굴하지 못했다.

이한빛이 9일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샹드마르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레슬링 여자 자유형 62㎏급 16강전에서 독일 루이사 니메쉬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렸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서 동메달 1개에 그친 것이 신호탄이었다. 급기야 2020 도쿄(2021년 개최) 대회에선 빈손으로 돌아왔다. 1972 뮌헨 대회 이후 49년 만이었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AG)에서도 동메달 2개에 머물렀다. 한국이 AG에서 은메달도 따지 못한 건 1966 방콕 대회 이후 57년 만이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은 없었다. 3명이 파리에 간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변화가 시급하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얕다. 새로운 얼굴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오랜 기간 한국 레슬링의 중심을 잡아줬던 김현우가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류한수도 은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AG 등 큰 대회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더 힘든 운동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외면을 받고 있다. 역시 위기를 마주했던 태권도, 유도 등이 이번 올림픽서 반전을 꾀한 것과는 다른 그림이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