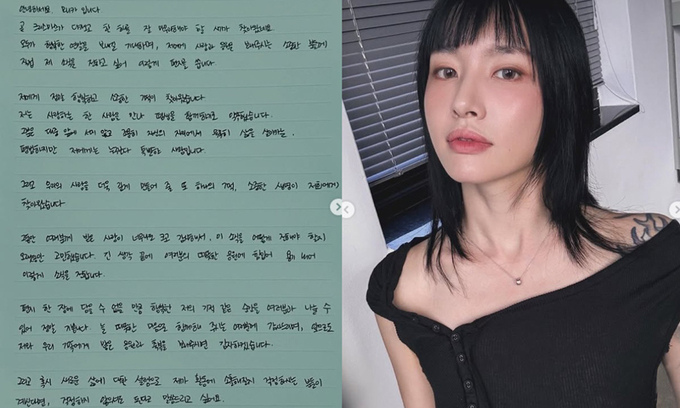근간이 흔들린다.
야구는 예측이 어려운 종목이다. 투수와 타자의 대결에서부터 수비, 주루플레이 등 다양한 상황이 얽혀있다. 규칙도 많고 복잡하다. 기준이 중요한 까닭이다. 심판진의 판정 하나하나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끊이지 않는 ‘오심’ 논란이다.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승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정들이, 그것도 시즌 내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분명 큰 문제다. 스포츠의 근간인 공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은폐 의혹에
야구는 사람의 눈을 바탕으로 한다.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다만, 경기가 평균 3시간 이상 진행되다 보니 물리적 한계가 있다. 기술적 장비들이 하나둘 더해지는 배경이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이어 올해는 전 세계 리그 최초로(1군 기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이 도입되기도 했다.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투구 궤적을 추적, 볼-스트라이크 여부를 판정한다. 핵심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볼 판정이다. 불필요한 논쟁이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기계지만,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4월 14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 NC전이었다. 3회 말 투수 이재학(NC)이 이재현(삼성)을 상대로 2구째 직구를 던졌다. ABS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지만 주심은 볼로 분류했다. 심판진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라는 대화가 중계화면에 포착됐다. 은폐 의혹까지 더해졌다.

◆자기 재량까지
자꾸만 예외를 만든다. 18일 잠실에서 펼쳐진 두산과 NC전이 대표적이다. 포스아웃 상황을 태그아웃 상황으로 착각했다. 두산 측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을 때에도 태그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다. 원심 유지 결론이 나온 이유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뛰쳐나와 항의한 뒤에야 문제를 인지했다. 결국 비디오 판독 결과를 뒤집었다. 이번엔 NC 측에서 어필했다. 비디오 판독실의 최종 판단은 뒤집을 수 없다. 오심을 바로잡기 위해 규정을 어긴 셈이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다. KBO리그 규정 제28조 11항에 따르면 비디오 판독 결과는 검토 혹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감독이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할 경우 자동 퇴장 조치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감독들이 경기 중 자리를 비워야 했다. 가차 없이 퇴장을 외쳤던 심판진들이 이번엔 재량으로 전례를 뒤집었다. 앞으로 비디오 판독 과정 혹은 결과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심판진들을 향한 시선에 의심이 쌓여간다.
◆흥행에 찬물
올 시즌 프로야구는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500만 관중을 돌파했다. 332경기만으로, 201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다. 10개 구단 체제가 된 2015년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가장 빠르다. 경기 당 평균 관중이 30% 이상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꿈의 1000만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흔들린다. 그때그때 땜질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