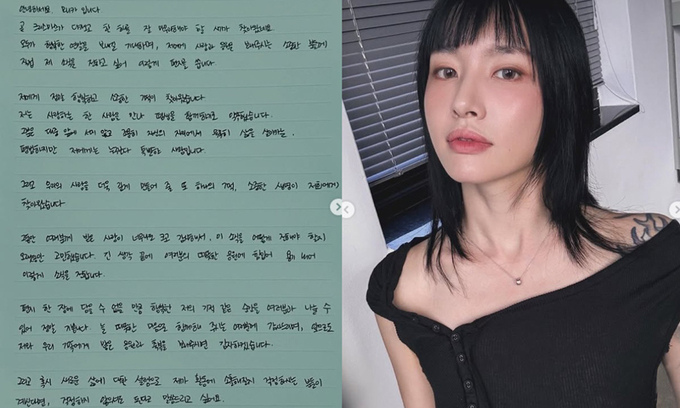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우리 모두가 한국 펜싱 국가대표입니다.”
한국 펜싱은 강하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강렬했다. 특히 남자 사브르의 질주가 놀랍다. ‘에이스’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한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광역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뉴 어펜져스(펜싱+어벤져스)’는 거침없이 내달렸다. 파리 그랑팔레서 연달아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개인전, 단체전을 모두 접수했다. 한국 펜싱이 단일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12년 런던(금2·은1·동3) 이후 12년 만이다.

◆ 주몽의 DNA, SK의 전략지원
주몽의 후예라고 했던가. 기본적으로 남다른 DNA가 장착돼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번 올림픽만 하더라도 칼(펜싱), 활(양궁), 총(사격) 등 전투 무기와 관련된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재능이라는 씨앗이 있다 해도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의 일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펜싱은 유럽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다. 종목조차도 조금은 생소한, 우리와는 조금 먼 듯한 귀족 스포츠의 이미지가 강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다. SK텔레콤이 대한펜싱협회장사를 맡았다.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을 시작으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신헌철 전 SK에너지 부회장을 거쳐 현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까지 긴 시간을 함께했다. 누적 지원 금액만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폭적인 지원은 한국 펜싱의 기폭제나 다름없었다. 펜싱을 널리 알린 것은 기본이다. 보다 많은 유망주들을 펜싱으로 이끌며 선수층을 탄탄하게 다져나갔다.

◆ 시야는 넓히고, 환경은 맞추고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넓어진 시야다. 국제대회 출전을 적극 지원했다.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과 국제그랑프리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에 파견하는 인원과 기간을 늘렸다. 과거 상위 랭킹 위주로, 일부만 나설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그림이다.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경기를 펼치는 것만큼 좋은 자극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회를 준비하며 선수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발전해나갔다. 차곡차곡 쌓이는 경험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체계화된 훈련 시스템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협회는 5000여만 원을 투입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모의 올림픽 경기장을 마련했다. 최대한 파리올림픽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쓴 것. 경기 시간과 실제 진행 순서 등을 맞추는 것은 물론, 소음이나 오심 상황을 대비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했다. 제대로 통했다. 종주국 프랑스 홈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선수들은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했다.

◆ 마지막 퍼즐, 땀방울에 대한 인정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킨 것은 선수단의 땀방울이다. 피스트 위에서만큼은 모든 것은 쏟아 부었다. 그 순간만큼은 선·후배가 아닌, 오롯이 선수 대 선수로만 존재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세대교체 또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번 올림픽 단체전 당시 맏형 구본길이 흔들리자 후배 도경동이 “왜 자신감 없이 하느냐”고 지적한다. 이를 전해들은 구본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나이, 경력을 떠나 서로를 인정했기에 가능한 장면이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