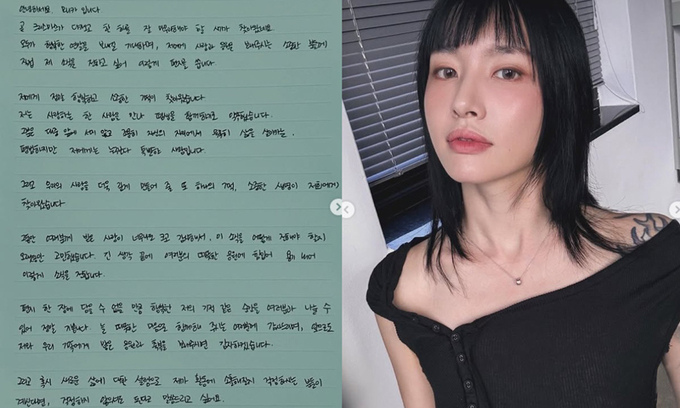한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방식, 이론, 규범 등을 일컬어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프로배구 V리그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외국인 감독 열풍이다.
개막 전부터 외국인 감독 열전으로 시선을 모았다. 남자부 7개 팀 중 무려 5개 팀이 외국인 감독과 함께 올 시즌을 준비했다. 4년차 토미 틸리카이넨(핀란드·대한항공)과 2년차 오기노 마사지(일본·OK저축은행) 두 감독을 필두로 필립 블랑(프랑스·현대캐피탈), 마우리시오 파에스(브라질·우리카드) 감독 등 새 얼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KB손해보험은 미겔 리베라(스페인)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자 마틴 블랑코(아르헨티나) 수석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올려 외국인 감독 선호 기조를 확실히 했다. 여자부에서도 마르첼로 아본단자(이탈리아) 감독이 지난해 2월부터 흥국생명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항공의 성공 신화가 한몫했다. 2020~2021시즌 로베르토 산틸리(이탈리아) 감독부터 시작해 틸리카이넨 현 감독과 통합 4연패를 일궈낸 바 있다. 오기노 감독을 선임한 OK저축은행도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프로배구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기대 반, 우려 반 양면성이 공존한다. 우선 외국인 감독을 통해 오랜 숙제인 리그 선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육성부터 전술까지 해외 선진 시스템이 도입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정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진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지도자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감독의 경우 ‘사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독은 물론 코치 자리도 국내 지도자가 설 자리가 없다. 이미 타 종목에서는 이러한 바람이 한차례 불었다. 축구의 경우 거스 히딩크 감독을 통해 대성공을 거뒀다. 반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사례처럼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야구 역시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현재 야구에서는 단 1명의 외국인 감독도 없다.
이세호 강남대 스포츠복지학과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과거 프로배구 감독은 대부분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자리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향후 5년 동안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 상황에 자극을 받아 공부하는 지도자가 늘고 있다. 우리 사회 트렌드가 끊임없이 변하듯, 배구 역시 외국인 감독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진출 및 연수를 통해 지금의 공백기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국내 지도자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훗날 외국인 감독들을 제치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노리는 날이 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