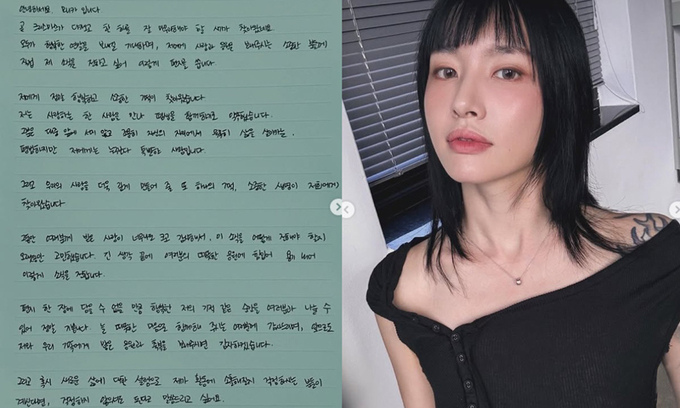이제 겨울이 오려는 걸까요? 이번 주 초부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손끝과 귀가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한 것이 먼저 생각납니다. 뜨거웠던 여름 내내 치킨에 맥주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메뉴가 바뀔 때가 된 것 같죠. 혹시 공식처럼 날씨에 따라서 드시는 음식 있으실까요?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김치전이 떠오르고요, 찬 바람이 불어오면 왠지 호빵과 따끈한 어묵탕을 먹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어묵탕엔 따끈한 정종이 더 어울린다 하시겠지만요.
음식 중엔 같이 먹으면 양쪽의 맛이 모두 상승하면서 더 맛있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요즘엔 맛뿐 아니라 영양적인 면까지 함께 보면서 음식 궁합이 좋네, 나쁘네 라고들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주류, 그중에서도 와인이 대중화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엔 생선 요리는 화이트 와인과, 붉은 고기 요리는 레드 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진리인 양 먹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촌스러움을 비웃는 듯 고급 식당에서는 요리에 맞는 와인을 각각 어울리는 것으로 페어링 해서 메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리와 주류의 합이 얼마나 중요(?)하면 결혼이라는 뜻의 ‘마리아쥬’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얼마 전 한 위스키 브랜드에서 오크통에서 숙성한 후 마지막 몇 년간을 다른 술통에서 마무리한 위스키를 시음하는 자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술통이, 샴페인 통이냐, 레드와인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풍미가 달라지는지 몰랐네요. 단독 시음보다도 음식과 함께할 때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전 스테이크를 먹을 때 위스키를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레드와인보다도 와인통에서 숙성을 마무리한 위스키가 스테이크의 맛과 더 잘 어울렸고요. 꼬냑통에서 마무리한 위스키는 달콤한 디저트와 천생연분 같은 맛이었습니다. 역시 맛의 세계를 탐구할 때는 선입견을 없애고 음식의 맛으로만 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처럼 해산물에 소비뇽 블랑보다 조개껍데기에 담긴 소주가 더 맛있을 수 있고요. 얼큰한 감자탕을 스파이시한 쉬라즈와 함께 먹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마리아쥬 역시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