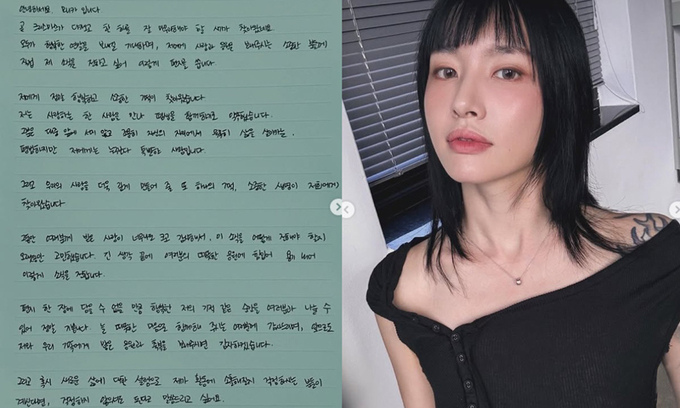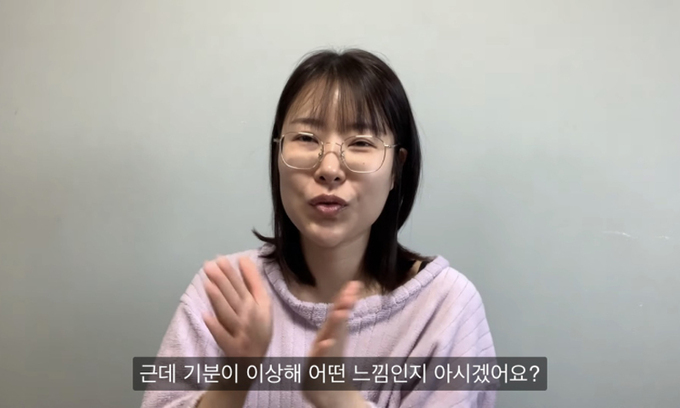“중요한 것은 완주까지의 과정이죠!”
출발선 위에선 모두가 희망을 품는다. 더 빨리, 더 높이 나는 꿈을 꾼다. 현실은 훨씬 더 차갑다. 목표지점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고통이 느껴져도 참고 버텨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결승선을 밟을 수 있다. 육상과 인생이 맞닿아있는 지점이다. 육상 10종 경기의 새 이정표를 세웠던 김건우 전 국가대표는 “누구나 1등을 원하지 않나. 중요한 것은 완주까지의 과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우연히, 벼랑 끝에서 마주한
육상 10종 경기(Decathlon). 조금은 생소한 이 종목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가지 잘하기도 힘든데 무려 10가지 종목을 해내야 한다. 엄청난 체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은 기본, 다재다능해야 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 100m 달리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던지기, 400m 달리기를 치른 뒤 둘째 날 110m 허들,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1500m 달리기를 한다. 각 종목 점수를 합친 총점으로 최종 순위를 가린다.
10종 경기가 낯선 것은 김건우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육상을 정식 시작한 것은 10살 때였다. 처음엔 그저 달리는 것이 좋았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의 벽과 마주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종목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경북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달리기에서 도약 종목으로 한 차례 변화를 꾀했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6개 대회 중 3개를 마친 뒤 운동을 그만뒀었다. 운동반에서 공부반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 부은 육상. 그대로 놓기 어려웠다. 최후의 보루로 10종 경기를 찾았다. 김 대표는 “수업 중 창밖을 바라봤는데,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더라. 나는 왜 안 될까 싶었다”고 말했다. 그때 고교 육상부 코치 중 한 분이 10종 경기를 제안했다. 감독이 말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 대표는 “다른 친구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 해 보기로 약속하고 도전을 허락받았다”고 귀띔했다.


◆ 운명처럼, 활짝 날개를 핀
운명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10종 경기로 전향한 지 2주 만에 대회에 나섰다. 심지어 공부 반으로 잠시 옮기면서 공백도 생긴 상태였다. 김 대표는 “5800점 이상이면 메달권이라고 하더라. 그렇게만 된다면 일단 대학 문제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었다”면서 “시합 전 연습경기를 치러봤는데 5150점 정도가 나왔다. 불가능해 보였다”고 떠올렸다. 단, 가장 친한 친구 중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다. “그 친구의 경기를 계속 떠올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주목하는 이는 없었다. 김 대표는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첫째 날 경기를 마친 뒤 버스가 날 태우지 않고 가버렸다”고 허탈해했다. 반전의 서막을 알린 것은 장대높이뛰기다. 친구의 응원 속에서 과감한 도전을 꾀했다. 연습 기준 최고 기록은 2m70㎝. 첫 시도에 3m를 신청했다. 감독 및 코치가 불같이 화를 냈다. 1차, 2차 모두 실패했다. 마지막 시도에서 극적으로 넘었다. 이후 3m80까지 연이어 성공했다. 이날 김 대표는 학생 신기록을 세웠다.
10종 경기 선수로 출전한 첫 대회서 생애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터. 김 대표는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주변에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운이 좋다고도 말했다. 더 보여주고 싶었다. 반짝이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우승), 전국체전(당시 시범경기·준우승) 등에서도 연이어 학생 신기록을 작성했다. 멈추지 않았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AG), 아시아육상선수권 등 세계대회로 향했다.


◆ 정상으로, 거칠 게 없었던
수많은 업적을 빚었다. 2006 도하 AG 동메달, 2010 광저우 AG 은메달을 획득했다. 2000 자카르타, 2005 인천 아시아선수권에선 연이어 은메달을 품었다. 특히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토록 바랐던 꿈의 무대에 섰지만 서러움이 컸다. 이렇다 할 코치진도 없어 주변 도움을 받아 발목 테이핑을 마쳤다. 오기가 생겼다. 1500m 달리기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때 세운 한국신기록(7860점)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정신적으로 한층 성숙해진 시기였다. 2010 광저우 AG를 앞둔 시점. 사실 김 대표는 부상과 싸우고 있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아슬아슬하게 놓친 뒤 다소 무리한 스케줄을 감행했다. 훈련 또 훈련이었다. 김 대표는 “스스로에게 취해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탈이 나기 시작했다. 2008년 오른쪽 뒷 근육이 파열되더니 2009년엔 왼쪽 근육을 다쳤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광저우 AG를 뛰었다. 그때의 깨달음은 2011년 세계선수권에까지 이어졌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배운 것도 많다. 미국의 트레이 하디가 대표적이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다. 김 대표는 미국까지 날아가 트레이 하디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다. 김 대표는 “정말 귀찮게 했던 것 같다”면서 “문화 자체가 다르더라. 큰 대회가 있으면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해서 가려고 노력했다. 트레이 하디는 다르더라. 집중력 있게 훈련하되, 쉬는 것도 중요하더라”고 밝혔다.


◆ 한 걸음 뒤에서, 인생의 깨달음
2017년. 30년 가까이 함께했던 육상 트랙을 벗어났다.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했다. 여러 방면으로 활약했다. ‘그라운드 K’라는 이름의 육상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세우는가 하면 해설위원으로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다.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 코치는 “10종 경기는 10개 종목서 잘해야 하나의 메달을 딸 수 있지 않나.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 해설할 때 등 도움이 많이 됐다”고 웃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2013년 태극마크를 내려놓으며 “10년 후엔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김 대표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 중이다. 김 대표는 “꽤 오랜 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심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솔직히 내 한국 기록은 10종 경기로선 높지 않다. 기록이 유지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그걸 깼을 때 더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육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인생도 그렇지 않나.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그런데도 계속 살아가지 않나.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결과까지 좋으면 베스트지만, 그 과정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얻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