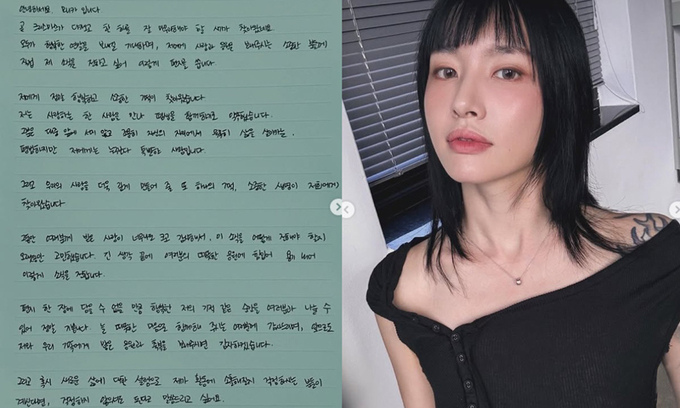완벽했던 신(新)과 구(舊)의 조화였다.
KBO리그 2024시즌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KIA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점쳐졌다. 탄탄한 투타 밸런스가 전문가들의 구미를 당겼다. 변수는 딱 하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온전한 멘탈 없이는 실력도 발휘될 수 없는 법. 하지만 훌륭한 더그아웃 리더들과 더할 나위 없는 재능을 뽐내는 영건들이 한 데 뒤섞인 KIA는 위기를 스스로 타개할 힘을 갖춘 팀이었다.
◆또, 또 ‘최형우’

정규시즌 우승이 확정되고 소감을 전하던 자리. 모두가 입을 모아 꺼낸 이름이 있었다. 바로 팀 최고참 1983년생의 최형우였다. 1981년생의 이범호 감독과는 단 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에게는 말 그대로 대선배다. 하지만 그를 불편해하는 KIA 선수는 없다. 시종일관 여유 있는 미소로 동생들에게 다가간다. 20살이나 어린 2003년생 김도영에게 라커룸에서 ”한국시리즈도 우승 시켜줘”라고 농담을 건넬 수 있는 편안한 동네 형이다.
타석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친다. 115경기 타율 0.280(422타수 118안타) 22홈런 108타점으로 녹슬지 않은 해결사 면모를 자랑한다. 인성이나 실력 모두 든든한 ‘맏형’ 그 자체다.
양현종은 최형우를 향해 “최고참인데도 어린 선수들과 대화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라운드에서만큼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주문해주신다. 그게 어린 선수들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엄지를 세운다. 나성범도 “형우 형이 KIA 적응부터 이렇게 우승 주장이 되기까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 존재만으로 든든한 선배이지 않나. 정말 감사드린다”고 웃었다.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친다. 최형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두 명 잘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든 정규시즌 우승”이라며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동생들에게 정말 고마울 뿐”이라고 모든 공을 후배들에게 돌렸다.
◆‘All New’ 타이거즈

타이거즈는 리그를 대표하는 ‘군기 구단’이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조금은 더 경직됐고 선후배 간 규율도 엄격한 팀이었다. 신인들이 입단 전부터 으레 겁을 먹을 정도였다.
지금의 타이거즈는 다르다. 이범호 감독을 필두로 최형우, 양현종, 나성범, 김선빈 등의 선배들이 완전히 다른 팀 분위기를 만들었다. 덕분에 ‘아기 호랑이’들은 제 능력을 펼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시즌 최우수선수(MVP)를 바라보며 KS 직행에 혁혁한 공을 세운 김도영이 “입단했을 때 우리 팀은 제가 알던 KIA가 아니었다. 잡아줄 때 잡아줄 선배가 계시고,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시는 선배가 계신다. 고참 선배님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크다”며 “저처럼 어린 선수들이 편하게 야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일 정도다.
정작 주장 나성범은 “선수들에게 큰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도 한데, 딱히 뭐라 할 정도의 행동이나 벗어나는 행동 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며 “각자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인지하고 시즌을 치러줬다. 그런 일들 없이 잘 따라와준 게 고맙다”고 후배들에게 공을 돌린다.
멈추지 않고 피어나는 훈훈한 분위기. 이 속에서 그대로 열두 번째 KS 트로피를 바라보는 KIA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