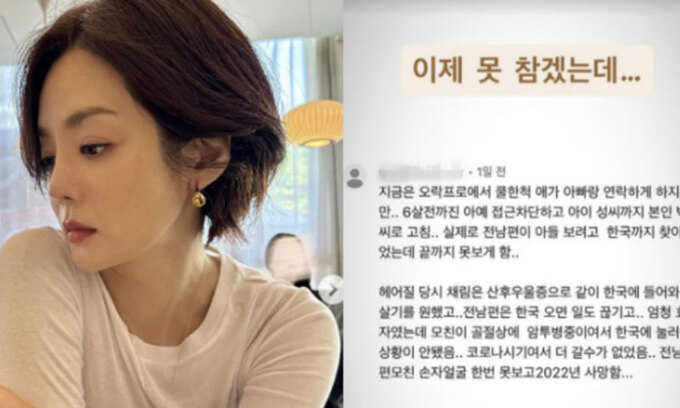[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메이저리그를 달군 ‘투타 겸업’, KBO리그에선 어떨까.
언제부터인가 ‘이도류’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도류란 양손에 칼을 한 자루씩 쥐고 싸우는 기술을 뜻하는 검술 용어로, 야구에서는 ‘투타 겸업’을 지칭한다. 최근 이 부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은 오타니 쇼헤이(25·LA 에인절스)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오타니는 투수로서 10경기에 등판해 4승2패 평균자책점 3.31 63탈삼진을 기록했고, 타자로서는 104경기에서 타율 0.285리(326타수 93안타) 22홈런 61타점 10도루 등을 올렸다.

오타니뿐 아니다. ‘투타 겸업’은 메이저리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시내티의 마이클 로젠델(27)는 투수지만 타격 실력 또한 뛰어나다. 지난해 7월 1일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는 7회말 대타로 나와 만루홈런을 때려내기도 했다.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와 한솥밥을 먹게 된 맷 데이비슨(28)과 브렛 아이브너(31) 등도 ‘투타 겸업’이 가능하다. 자레드 월시(25·LA에인절스)의 경우 내야수로 구분돼 있지만, 투수 훈련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O리그에서도 ‘투타 겸업’을 몸소 보여준 이들이 있다. 해태(현 KIA) 출신 김성한(61)과 OB(현 두산) 출신 박노준(57)이다. 특히 김성한은 1982년 두 자릿수 승수(10승)와 3할 타율(0.305)을 모두 달성하기도 했다. 서울고 시절 당시 투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강백호(20·KT)는 프로 입단 때부터 ‘투타 겸업’ 가능성을 엿보이며 주목받았다. NC의 새로운 외인 타자 크리스티안 베탄코트(28) 또한 미국에서 투수 수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투수와 타자는 필요한 근력도 다르고, 훈련 방식도 다르다. 체력소모가 높을 뿐 아니라, 부상 위험 또한 높다. 선수 본인의 의지가 단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주위의 지지와 성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타 겸업’ 선수가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야수를 투수로 쓸 수 있다면 불펜 운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KBO리그에서도 신선한 볼거리가 펼쳐질 수 있을 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hj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