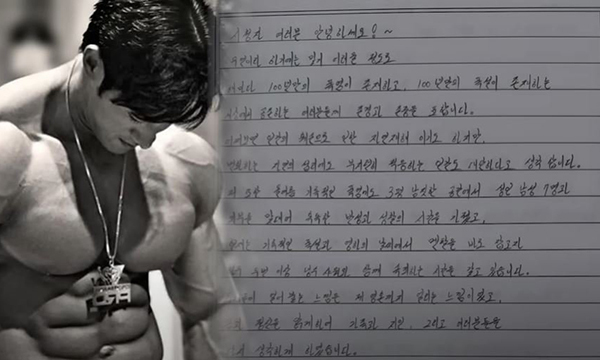좌절할 때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29년 만의 통합우승을 맛본 프로야구 LG는 왕조 구축을 천명했다. 해태, SK, 삼성, 두산 등만이 차지해온 타이틀이다. 트로피에 닿기까지 LG가 보여준 힘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는 도전이었다.
계획대로만 되는 일은 없다. 생각보다 시즌은 버거웠다. 야심 차게 재편한 선발진은 여전히 약점이었다. ‘장수 외인’ 케이시 켈리와 눈물의 작별을 택할 정도로 과감히 움직였지만, 원하는 결과는 아직이다. 설상가상 불펜마저 헐거워졌다. 고우석의 미국행, 함덕주의 부상 등 외적 요인에 기존 멤버들의 부진이 겹쳤다. 얼마 전 베테랑 김진성과 염경엽 감독 사이 불거졌던 잡음은 뭔가 삐그덕거리는 LG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해 팀 타율 1위(0.279)로 타올랐던 타선도 문제다. 우승 주역 박해민, 김현수, 오지환 등 베테랑들의 방망이가 방황한다. 오스틴 딘이 LG 외인 최초로 3할 타율-30홈런-100타점으로 날아다니지만 고군분투다.
1위 KIA를 위협하던 LG는 없다. 2위를 향한 실낱 희망을 품은 3위로 끝을 향해 간다. 2위 삼성과의 격차는 4경기(9일 기준). 불가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준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어쨌든 1위는 물 건너갔다. 다시, ‘올라가는 야구’를 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직행 전까지 4년 연속 아래서부터 가을 야구를 헤쳐갔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긴 우승 공백이 선수들을 짓눌렀고, 자신감은 떨어졌다. 이 기간 업셋만 2번을 당했을 정도로 포스트시즌의 LG는 무기력했다.

지금 필요한 건 정규시즌 1위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지울 ‘무언가’다. 새 얼굴이 채우는 LG 뎁스에 주목하는 이유다.
LG의 백업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탄탄하다. 내야에는 지난해 상무 제대를 알린 ‘만능열쇠’ 구본혁이 있다. 성실히 키워온 야구 재능을 1군 무대에서 펼쳐놓는다. 내야 전 포지션을 돌면서도 탄탄한 수비는 그대로다. 내야 주전 로테이션 가동은 모두 그가 있어 가능했다. 성장한 방망이도 더해진다.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타석(354타석)을 소화하며 타율 0.256(312타수 80안타)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까지 그의 통산 타율은 1할대(0.163)였다.
군필 복덩이가 또 얹어졌다. 2021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7순위의 이영빈이다. 전도유망했던 고졸 내야수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고, 올해 상무 제대 후 7월 합류했다. 최고의 활력소다. 내·외야를 고루 채우는 그에게 사령탑의 손이 자꾸 간다. 정평 났던 화끈한 타격은 덤이다. 지난 8일 잠실 한화전에서는 시즌 첫 아치와 생애 첫 연타석포까지 수놓았다.

부활한 2차드래프트로 NC에서 건너온 우완 투수 이종준도 19경기 평균자책점 1.77(20⅓이닝 4자책점)로 설레는 1군 첫 시즌을 보낸다. 대주자, 대수비로 이름 알리기에 나선 최원영도 다가올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뉴 페이스’들이다.
다가올 가을은 이들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다. 염 감독 입장에서도 단기전 분위기를 바꿀 최고의 변수 카드다. 소위 ‘미친 선수’라는 타이틀로 얻을 수 있는 명성은 간절함으로 무장한 그들의 구미를 당기기도 한다. LG가 바라는 꿈의 시나리오, 이들의 어깨에 달렸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